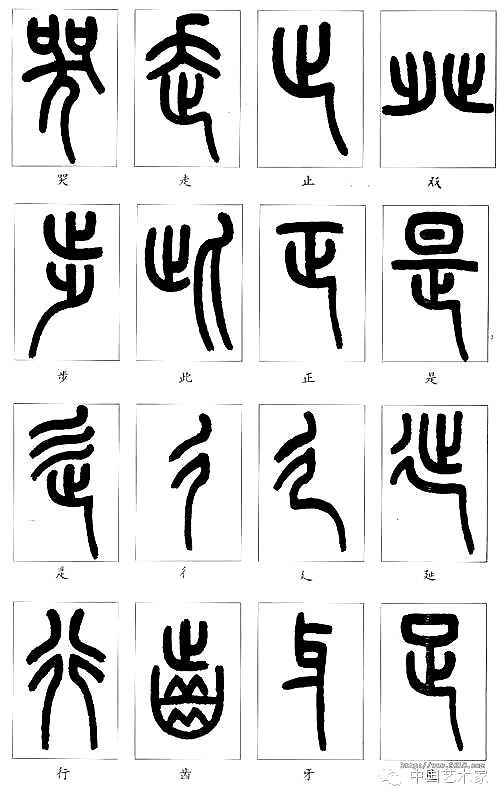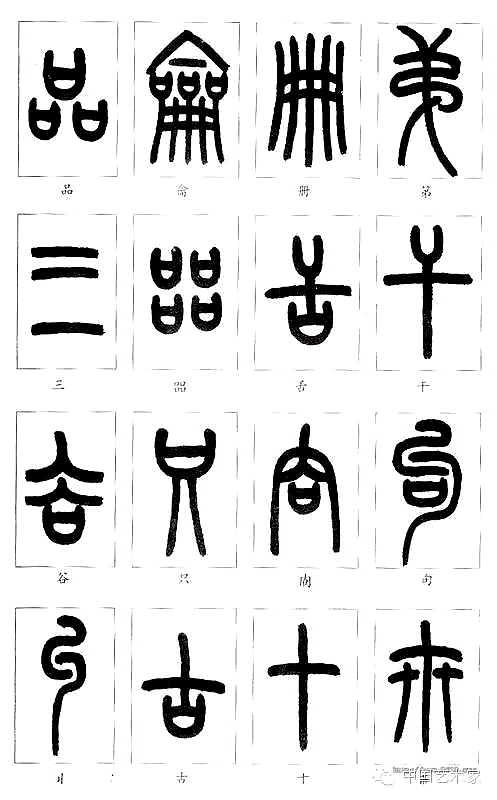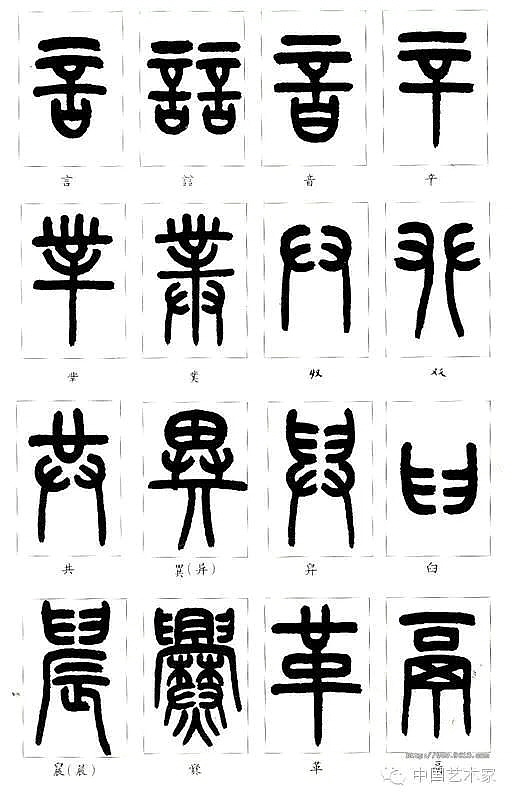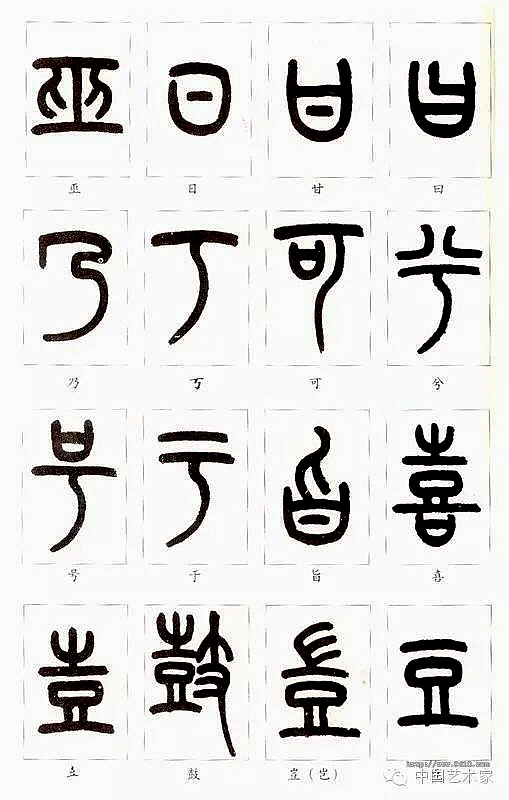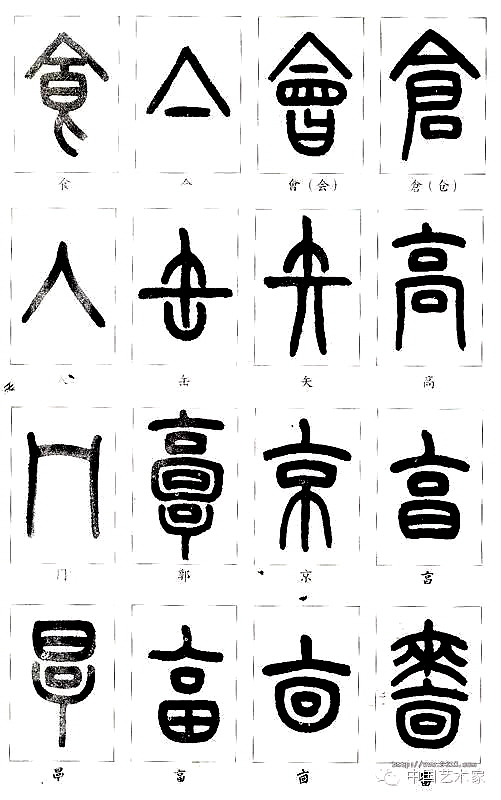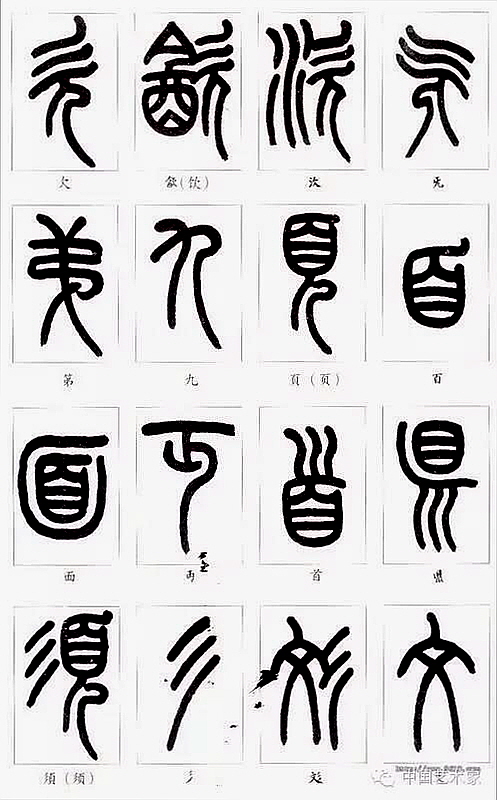100여년만의 동반공개,
매천 황현의 절명시와 만해 한용운의 추모시
매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매천 선생의 칠언절구 한시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매천 황현 선생 후손 소장
“어지러운 세상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에 이르도록(亂離滾到白頭年)
몇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가 이루지 못했네.(幾合捐生却未然)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今日眞成無可奈)
바람 앞 가물거리는 촛불 푸른 하늘 비추누나.(輝輝風燭照蒼天)…
새 짐승 슬피울고 바다와 산도 시름거리니((鳥獸哀鳴海岳嚬)
무궁화 세상은 다 망하고 말았네.(槿花世界已沈淪)
가을 등불 아래 책덮고 역사를 돌이켜보니(秋燈掩卷懷千古) 글
아는 사람 구실 어렵기만 하구나.(難作人間識字人)”

황현 선생의 ‘절명시’를 수록한 <대월헌절필첩>.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다.|매천 황현선생 후손 소장
우국지사이자 시인인 매천 황현(1855~1910) 선생이 1910년 경술국치를 맞아
더덕술에 아편을 타마시고 자결하면서 남긴 절명시이다.
황현 선생은 사직이 망하는 날 백성은 누구나 죽어야 옳다고 여겼다.
선생은 “사대부들이 염치를 중히 여기지 않고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종사를 망쳐 놓고도 자책할 줄 모른다”고 통탄했다.
만해 한용운은 이런 황현 선생의 순국에 감동하여 1914년 추모시 ‘매천 선생’을 친필로 써서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매천 황현 선생의 순국에 감동하여 직접 친필로 지은 추모시
‘매천선생’. 한용운 선생은 1914년 이 시를 황현 선생의 유족에게 직접 보냈다.
이 시는 황현 선생의 <사해형제>에 실려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이다.|매천 황현 선생 후손 소장
“의리로써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就義從容永報國)
한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一暝萬古劫花新)
이승의 끝나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莫留苦忠不盡恨)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있으리.(大慰苦忠自有人)”
문화재청이 19일부터 3월14일까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10, 12옥사에서 개최하는 ‘문화재에 깃든 100년전 그 날’ 특별전은
조선말기 우국지사 ‘매천 황현’의 유물들로 시작한다.
전남 순천의 황현 선생 후손들이 100년 넘게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한 자료들이다.
칠언절구 절명시 4수가 수록된 <대월헌절필첩>과,
만해 한용운 선생(1879~1944년)이 직접 써서 황현의 유족에게 전해준 ‘매천선생’ 시,
그리고 그 시를 실은 황현의 <사해형제> 등이 그것이다.
또 황현 선생이 안중근 의사(1879~1910)의 공판기록과
안의사가 하얼빈(哈爾濱) 의거 전에 남긴 시 등을 꼼꼼히 스크랩하고
밑줄까지 표시한 <수택존언(手澤存言)>도 역시 첫선을 보인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기 이틀 전인
1909년 10월24일 저녁에 지은 시(‘장부처세가’)는 영웅적인 기상을 뽐내고 있다.

황현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공판기록과 안의사가 하얼빈 의거 전에 남긴 ‘장부처사가’ 등을 꼼꼼히 스크랩하고
빝줄까지 표시한 ‘수택존언’ 등도 공개된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丈夫處世兮) 그 뜻이 크도다.(其志大矣)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時造英雄兮)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英雄造時) 천
하를 굽어보니(雄視天下兮)
어느 날에 큰 일을 이룰꼬.(何日成業)
동풍은 점점 차가우나(東風漸寒兮)
장사의ㅡ 의지는 뜨겁도다.(壯士義熱)…”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23일) 이번 특별전에서는 황현 선생의 안경과 벼루, 필가 등도 선을 보인다.

매천 황현 선생의 생활유물들. 안경과 벼루, 필가 등이다.|순천대박물관 소장
특별전에는 최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예고된 독립 운동 관련 유물들이 대거 선보인다.
최근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의 선서문과 의거관련 유물도 선보인다.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보물제 568-1호)도 출품되므로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또 등록문화재가 된 ‘일제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제 730호)도 공개된다.
안창호·윤봉길·유관순·김마리아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4858명의 신상카드는 물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 3·1운동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의 활동상황도 소개된다.
또한 지난해 등록문화재가 된 이육사 시인(1904~1944)의 친필원고인 ’편복‘(제713호)와
’바다의 마음‘(제738호)은 희귀자료다. 현재까지 딱 두 편 남은 이육사의 친필원고이기 때문이다.

심훈의 <상록수> 친필원고 .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위한 초고형태로 1935년 7월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심훈기념관 소장
특별전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 선생(1887~1958)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록문화재 제740호)도 공개된다.
이 강령초안은 삼균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또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의 붓글씨인 ‘백범 김구 유묵 신기독(愼其獨·홀로 있을 때도 삼가다)’
(등록문화제 제442-2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글씨와 1945년 초판발행하여
국어·중국어·영어 순으로 가사를 배열한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등록문화재 제576호) 등도 출품된다.
젊은 도쿄(東京) 유학생들이 1919년 2월8일 발표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2·8독립선언서’도 전시된다.

이육사의 친필원고 ‘편복’.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이육사 문학관 소장
심훈 선생(1901~1936)의 <상록수> 친필원고 9장 중 3장과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의 핵심인물인
이규채 선생(1890~1947)의 일기과 사진도 원본으로 전시된다.
이밖에도 중국 중칭(重慶) 망명중이던 이시영·김구·유동열·김규식 등 23인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8·15해방과 더불어 중칭을 떠나던 전날 저녁에 모여 각자의 포부와 기대를 붓으로 옮긴
<제유기념첩>도 반드시 봐야할 유물이다.
<광복군가집 제1집>(등록문화재 제474호)과 ‘루즈벨트 외교서한’도 볼거리다.
'사는이야기 > 붓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여선생 특별전 (0) | 2019.05.22 |
|---|---|
| 선암사 (0) | 2019.05.09 |
| 서예자료(명언,가훈) (0) | 2019.01.29 |
| 전서(篆書) (0) | 2019.01.27 |
| 이인상 고백행(枯栢行) (0) | 2019.01.27 |